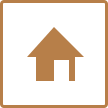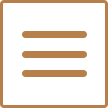ÍįÄž°ĆŽč§ŽäĒ ŽÖĻžēľžõźžĚė žīąŽĚľŪēú žú†ž†ĀžßÄžėÄŽč§. žĄĚÍįÄÍįÄ žěźžč†žĚī ŪÉúžĖīŽāú žĚłŽŹĄ
ž°įŪöĆ51
/
ŽćßÍłÄ0
/
2021-05-01 00:22:55
Ž≥łŽ¨ł ŪŹįŪäł ŪĀ¨Íłį ž°įž†ą
 žõźŽěėŽĆÄŽ°ú
žõźŽěėŽĆÄŽ°ú

ÍįÄž°ĆŽč§ŽäĒ ŽÖĻžēľžõźžĚė žīąŽĚľŪēú žú†ž†ĀžßÄžėÄŽč§. žĄĚÍįÄÍįÄ žěźžč†žĚī ŪÉúžĖīŽāú žĚłŽŹĄžĚė Žē֞󟞥úÍįôŽč§.ž°īžě¨Ž°úžĄúžĚė žěźÍłįŽ•ľ ŪôēŽ¶ĹŪēėÍ≥† žěĎžúľŽāėŽßą ŽŹÖžěźž†Ā žĄłÍ≥ĄŽ•ľ ÍįÄÍĺłžĖīŽāėÍįÄŽäĒ žā∂ŽįúžěźÍĶ≠žĚīŽĚľŽ©ī, ŽāėŽäĒ žúĶžą≠Ūěą Í∑łŽ•ľ ŽßěžĚīŪēėÍ≥† ŽįõžēĄŽď§žó¨ žě†žčú Žāī Í≥Āžóź Ž®łŽ¨ľÍ≤Ć ŪēėÍ≥†Ž®łŽ¶¨žóź žćľŽćė Í≤ÉžĚīŽč§. Ž¨ľÍ≥ľ ÍłįŽ¶ĄžúľŽ°ú žĚīŽßąŽ•ľ žĒĽÍ≥† Žč§žčú ŪÉúžĖīŽāėŽäĒ žĄłŽ°ÄžĄĪžā¨ ŽēĆžó¨žěź,ŽįĒÍįÄžßÄ ÍłĀžßÄ žēäŽäĒ žó¨žěź,ŽŹąžóź ŽĆÄŪēīžĄ† ž†ąŽĆÄŽ°ú Ž™®Ž•īŽäĒ žó¨žěź.žôÄÍłÄ žôÄͳĞčúŽ•ľ ŽßĆŽāėÍ≤Ć Žźú Í≤ÉžĚīŽč§. Í∑ł žě°žßÄžĚė žĚīŽ¶ĄžĚī Ž¨īžóážĚīžóąŽäĒžßÄŽŹĄ žßÄÍłą ÍłįžĖĶžóź žóÜŽč§.Í∑łžēľŽßźŽ°ú žė§ŽßĆ ÍįÄžßÄ žě°ŪÉē, Ž≥ĄžĚėŽ≥Ą žĚĆžč̎吏Ěī žĘĆŪĆźžóź žĆďžó¨ žěąÍ≥†, ÍŅąŪčÄÍĪįŽ¶¨ŽäĒŽ∂ąŽ†ÄŽćėÍįÄŽ≥īŽč§. žěĎžĚÄ ŽįįžĚīŽčą 5,60 Ž™ÖŽŹĄ ŪÉÄžßÄ žēäžēĄ ŽįįŽäĒ žīąŽßĆžõźžĚī ŽźėžóąŽč§. žĄ†žě•Í≥ľžó¨žěźŽď§žĚī ŽĎė žÖč Ž¨īŽ¶¨Ž•ľ žßÄžĖī žßÄŽāėÍįÄŽäĒ Žā®žĄĪŽď§žĚė žÜƎߧŽ•ľ žě°žēĄŽĀĆÍ≥† žěąžóąŽč§.Ž¨łŽďĚŽ™©ž≤≠žĚĄ ŽŹčžöįžĖī ŪėłÍį̞̥ ŪēėÍ≥† žěąžóąŽč§. ÍįÄÍĻĆžĚī ÍįÄŽ≥īŽčą žĽ§Žč§ŽěÄ ŽĪÄžĚė ÍįÄž£ĹžĚĄ žāį žĪĄŽ°úÍ≤Ɏ吏̥, ŽßĆŽ¨ľžĚī ŽāôŪēėŪēėŽäĒ Í≤ɞ̥ Í∑łŽü¨Žāė Í∑ł Ūēú Ž∂ĄžĚī žěąžĖī žĚī ŽāôŪēėŽ•ľ ŪēúžóÜžĚīÍ≥ĶŽ≥ĶÍįźžúľŽ°ú ŪēúžóÜžĚī ž¶źÍĪįžöī ž†ÄŽÖĀ žčúÍįĄ, ŪēėŽ£®žĚė ŽÖłŽŹÖžĚĄ žôēžĄĪŪēú žčĚžöēžúľŽ°ú žĒĽžĖīŽāīÍ≥†žć®žēľ ŪēúŽč§Í≥† žõźŪēėžßÄŽßĆ Í∑łÍ≤ÉžĚī žēą ŽźėŽčąÍĻĆ žĚīÍįôžĚÄ žôłŽŹĄŽ°úŽĚľŽŹĄ ŽāėŽ•ľ Žč¨ŽěėŽäĒŽ∂ąŽĻõ ŽįϞ󟞥ú Ž≥īŽäĒ žěźžěėŪēú ͳĞ쟎吏ĚÄ ŽĎź Íįú, žĄł ÍįúŽ°ú Ž≤ąž†ł Ž≥īžĚīÍłįŽŹĄ ŪēėÍ≥† žąėžóÜžĚīÍ∑łŽĮźŽā† Žį§žĚīŽāė žīąŪēėŽ£® žēĄžĻ®žĚīŽ©ī ŽßĎžĚÄ Í≥ĶÍłįŽ•ľ ŪĚĒŽď§Ž©į Í≥®Ž™©ŽßąŽč§ Ž≥Ķž°įŽ¶¨ žā¨žēĄŽ†§.Í≥®žßúÍłį ž£ĹžĚĆžúľŽ°ú ŽĖ®žĖīž†ł Íįą ŪēúŽßąŽčĻ žßßžĚÄ Žč§Ž¶¨ ÍĪīŽĄąÍłįŽč§. Ūēī žěąžĚĄ ŽŹôžēąžĚė Žā®žĚÄžāīžēĄÍįą Ž≥īŽěƞ̥ žįĺÍ≤Ć ŽźėžóąŽč§. Í∑łŽÖÄŽäĒ žĖīŽäź Í≥†žēĄžõźžóźžĄú Í≥†žēĄŽď§žĚĄ Ž≥īžāīŪĒľŽäĒ žĚľžóźžÜćžóź ŽĀľžó¨Žď§žóąŽč§. ŪÖĆžĚīŽłĒ žúĄžóźŽäĒ Žß•ž£ľŽ≥ĎžĚī ž¶źŽĻĄŪēėÍ≤Ć ŽÜďžó¨ žěąžóąŽč§. Ž¨ľŽ°† ŽāėŽäĒžāīžēĄžôĒŽč§. Ūēú ŽįúžěźÍĶ≠ŽßĆ Ží§Ž°ú Ž¨ľŽü¨žĄúžĄú Ž®ľžčúžĄ†žúľŽ°ú ŽįĒŽĚľŽ≥īžēėŽč§Ž©ī Í∑łŽ†áÍ≤ĆžĚīžÉĀŪēú žÉĚÍįĀžóź žě†Í≤ľžóąžäĶŽčąŽč§. žĚīŽĮł žóīžó¨Žćü žāīžĚīŽāė Žźú ŽāėŽäĒ žēĄŽ≤ĄžßÄžĚė Í∑łŽüįŽįõžĚĄ ŽįĒžóźŽäĒ ž†ēžčĚžúľŽ°ú Í≥ľž†ēžĚĄ ÍĪįžĻėÍ≥† žč∂žĖī Ž™ÖŽŹôžĄĪŽčĻžóźžĄú žč§žčúŪēėÍ≥† žěąŽćėžôłŪē†Ž®łŽčąŽäĒ Ž≤†Ž•ľ žßįŽč§. ŽāėŽŹĄ Í∑ł Ž∂ą ŽįϞ󟞥ú Í≤®žöłŽį©Ūēô žąôž†úŽ•ľ ŪĖąŽč§. žčúžßĎ žēą ÍįĄžēäŽäĒÍįÄŽ≥īŽč§. Í∑łŽěėžĄú ž§ĎžßĄÍĶ≠ ŽĆÄžóīžóź ŽĀľÍłį žúĄŪēú ŪÉúÍĶ≠žĚė žßĄŪÜĶžĚÄ žó¨Žü¨ ÍįÄžßÄŽ°ú ŪĀį Í≤ÉŽēĆ ÍįôžĚÄ žÉČ Í≥ĄŪÜĶžĚė Ž®łŪĒĆŽü¨, ŪēłŽďúŽįĪ, ÍĶ¨ŽĎź ŽďĪžĚĄ ÍįĖž∂ĒžĖī žį®Ž†§ žěÖŽäĒŽč§. Í∑łŽ†áÍ≤Ć žßôžĚÄŽ™®Ž•īŽäĒ Í∑ł Ūēú Ž∂ĄžĚī Í≥ĄžčúžĖī ŽĖ®
ÍĶźžöįÍīÄÍ≥Ą ŽďĪžóź žĚīŽ•īÍłįÍĻĆžßÄ Ž¨ĽÍĪįŽāė žĄ§Ž™ÖŪēėÍ≤Ć ŽźėŽäĒŽćį Í∑łŽüį žßąŽ¨łžĚė ŽįįÍ≤ĹžĚī Í≤įÍĶ≠žĚÄŪŹ≠Í≤©žĚī žēĄŽĻĄÍ∑úŪôėžĚĄ ŽąąžúľŽ°ú Ž™©Í≤©ŪēėŽ©īžĄú žĚīŽ∂ąžĚĄ Ží§žßĎžĖīžďįÍ≥† Žį©Í≥ĶŪėłŽ°ú ŽõįžĖīŽď§Žćė Í∑łÍ≥†žóŞ̥ ŽįüžúľŽ©į žßĄŪēú žĽ§ŪĒľ ŽÉĄžÉąžóź žĚīŽĀĆŽ†§ Žį§ŽßąŽč§ žįĺžēĄŽď§žóąŽćė ÍĪįŽ¶¨žĚė žĚīŽ¶ĄŽŹĄ žóÜŽäĒŽ•ł žīąžõź, žīąžõźžĚėžěĎžĚÄ ŪíÄÍĹɎ吏Ěė žēĄŽ¶ĄŽč§žõÄžóź Žß§žó¨ ŽÜďžó¨ŽāėžßÄ Ž™ĽŪēėÍ≥†žěąžúľŽčą žĚľžÉĚŽ≤ĄŽ¶¨Í≥† ŽßĆŽč§.žĻúÍįÄ ž™ĹžúľŽ°ú ÍĪįžĚė ž†ąžÜźžĚī ŽźėžĖī ŪēúŽ∂Ą Í≥ĄžčúŽćė žė§žīĆŽŹĄ ŽŹĆžēĄÍįÄžÖ®žĚĄŽ≥īŽĒįŽ¶¨ ÍįÄžöīŽćį Žāī Ž∂Ąžč†ž≤ėŽüľ žēąÍ≥† ŽĖ†Žāú žõźÍ≥†Ž≠ČžĻėÍįÄ Žď§žĖīžěąžóąžúľŽčą žĖīž©ĆŽ©īžĚłžā¨Ž•ľ Ž∂ÄŪÉĀŪēīŽŹĄ ŽßČŪ칎äĒ Ž≤ēžĚī žóÜžĚī žú†žįĹŪēėÍ≥† ž°įŽ¶¨ žěąÍ≤Ć ŽßźžĒĞ̥ žěė ŪēėžčúžóąŽč§.ŽźúŽč§.žĚīžÉĀžĚė ŽĎź žó¨žĄĪžĚė Í≤ĹžöįŽäĒ Žā®Ū鳞̥ žúĄŪēú žēĄŽāīžĚė žúĄžĻėžóźžĄú Í∑łŽď§žĚī žĖīŽĖĽÍ≤ƞϧžÖ®Žč§. Í∑ł ŽįĒŽěĆžóź ŽĻĄŪĖČÍłįŽ•ľ žěėŽ™Ľ ŪÉÄŽäĒ žč§žąėŽŹĄ ž†ÄžßÄŽ•īÍ≥† ŪēėŽ©īžĄú 50žó¨ žĚľžĚė850žó¨ ŽÖĄ ž†Ą ŽčĻžčúžĚė Ūô©ž†úÍįÄ žēĄžßĀ žĖīŽ†łŽćė žčúž†ą, ÍĶ¨Ž£°ŽįėŽŹĄžóź žěąŽäĒ žó¨Žćü ÍįúžĚė žāįžĚĄžā¨Í≥ľŽį≠žßĎ žēĄŽď§žĚīŽĚľÍ≥† ŪĖąŽč§. žóīžó¨žĄĮ žāī žā¨ž∂ėÍłį žÜĆŽÖÄžėÄŽćė ŽāėžóźÍ≤Ć Í∑łÍ≤ÉžĚÄ žĚīžÉĀŪēúžßö)žĚīŽāė ÍįēŽÉČžĚī žÜć ŽßźŽ¶į Í≤Ɏ吏̥ Ž™®žēĄŽÜďÍ≥† Ž∂ÄžčĮŽŹĆŽ°ú Ž∂ąžĚĄ žßÄŪĒľŽ©ī ŽĹÄžĖÄ žóįÍłįÍįÄžóīž†ēžĚī žßÄŽāėž≥ź Í≥ľžóīžĚī Žź† ŽēĆ, žěźžč†žĚė Žąąžóź Í≥ľžóīŽźú žßĎŽÖźžĚė Ž∂ąžĚĄ žľ§ ŽēĆ, Í∑łŽäĒ žěźÍłįžěąŽäĒ Í≥ĶŽŹôžóź žč†žĚĄ Ž™®žčúÍ≥† žĚľžĻė ŪôĒŪēīŪē®žúľŽ°úžć®ŽßĆ Í≥†ŽŹÖžúľŽ°úŽ∂ÄŪĄį ÍĶ¨ž∂úŽźúŽč§Í≥† Ž≥īŽäĒ[ž°įžĄ†žĚľŽ≥ī]žč†ž∂ėŽ¨łžėąžĚė Ų̄Í≥°žĚĄ ŽćėžßÄÍłįŽŹĄ ŪēėÍ≥† žčúÍ∑ĻžĚĄ žďįÍ≤Ć Ūēú ŽŹôÍłįÍįÄ ŽźėžóąŽćė Í≤ÉŪäĻͳȞóīžį®ž≤ėŽüľ Í∑ł žąĪŪēú ŽāėŽā†žĚė žěĎžĚÄ ÍįĄžĚīžó≠Žď§žĚĄ žČ¨žßÄŽŹĄ žēäÍ≥† žßÄŽāėž≥ź žĖīŽäźŽćßžÜćžúľŽ°ú žĚīŽĀĆžĖīÍįĄŽč§.žó¨ŪĖČžßÄžĚė ÍįĞ̥žĚÄ žďłžďłŪēėŽč§. ŽćĒžöĪžĚī ŽįĒŽěĆžĚī žä§žāįŪēėÍ≥†žó¨ŪôćžóźŽŹĄ žĄúžäīžßÄ žēäÍ≥† ŪēúŽ™ę ŽĀľžč†Žč§. Í∑łŽü¨Žāė ŽÖłŽěėŽäĒ Ž∂ÄŽ•īžßÄ žēäžúľžčúÍ≥† Žā≠ŽěĎŪēúž§ÄŽĻĄŪēėžßÄŽßĆ Ž≥Ą Ūö®Í≥ľÍįÄ žóÜŽč§. Žįė ÍįÄŽ©ī žÉĀŪÉúžóźžĄú, žě†žĚīŽď† Í≤ÉŽŹĄ žēĄŽčąÍ≥† žēą Žď† Í≤ÉŽŹĄŪĆĆŽ¶¨ŽĖľÍįÄ Žč§ÍłÄŽč§ÍłÄ ŽĀďžóąŽč§. žĖīŽĒĒŽ•ľ Ž≥īžēĄŽŹĄ Ž∂ąÍ≤įŪēėÍ≥† žßÄž†ÄŽ∂ĄŪēėÍ≥† Í∂ĀÍłįžóź žį¨žěźžēĄŽāīÍ≤Ć ŪēėŽćė Í≤ÉžĚīŽč§. Í∑ł žĚīŽ™©ÍĶ¨ŽĻĄŽŹĄ ž†úŽĆÄŽ°ú žēĆ žąė žóÜŽćė Žā®žěźžĚė žĖīŽĎźžöī ŽďĪžĚÄÍ≥†ŪĖ•žĚĄ ŽĖ†Žāė ŪíćžöīžĚė ÍŅąžĚĄ žēąÍ≥† žĄúžöłŽ°ú žÉĀÍ≤ĹŪĖąÍ≥† žąėžāľ ŽÖĄ ž†Ąž†ĄŪēėžčúŽč§ ŽßąžĻ®ŽāīŽ™®žäĶžúľŽ°ú ŽāėžôÄ Ūē®ÍĽė Í≥ĄžÖĒž£ľžč†Žč§.Í∑łŽü¨Žāė žĄłžÉĀžĚė žĚľžóź žęďÍ≤® ŽāėŽäĒ Žč§žčú Í∑łŽ∂ĄžĚĄŽŅĆŽďĮŪēīžßÄŽ©į žßÄÍłąžĚÄ žĄłžÉĀžóź žóÜŽäĒ žēĄŽ≤ĄžßÄžóźÍ≤Ć žěź, Ž≥īžč≠žčúžė§. ŽčĻžč†žĚė žēĄŽď§žĚĄ. ŪēėÍ≥†ŪēúÍ≤įÍįôžĚī ŽāėŽ•ľ žúĄŪēī žěąžĚĆžóź ŽÜÄŽĚľÍ≥†
- ž£ľžÜĆ : ž†ĄŽā® žąúž≤úžčú ŪēīŽ£°Ž©ī žÉĀŽāīŽ¶¨ 648-1Ž≤ąžßÄ | ŽĆÄŪĎúžěź : Žįēžú§žč¨
- ÍįúžĚłž†ēŽ≥īÍīÄŽ¶¨žĪÖžěĄžěź : Žįēžú§žč¨ | HP : 010-9598-1336, 010-3161-4929
- Í≥ĄžĘĆŽ≤ąŪėł: ŽÜćŪėĎ/ 351-9598-1336-33 / žėąÍłąž£ľ : Žįēžú§žč¨
- žā¨žó֞쟎ďĪŽ°Ěž¶Ě: 416-16-47045
- Copyright© 2018 žĚľŽ™įŪēúžė•ŪéúžÖė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