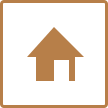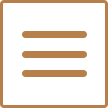žĖĎŽßĆ Žć§Žć§Ūěą ŽįĒŽĚľŽ≥īžēėŽč§.ŽĹēžĚī ŽāėžĄú ŽľČŽĒįÍĶ¨ŽŹĄ Ž™Ľž∂ĒŽ¶¨Íłįž†Ąžóź Ūõ®Ūõ® Ž≤ó
ž°įŪöĆ33
/
ŽćßÍłÄ0
/
2021-06-02 19:39:24
Ž≥łŽ¨ł ŪŹįŪäł ŪĀ¨Íłį ž°įž†ą
 žõźŽěėŽĆÄŽ°ú
žõźŽěėŽĆÄŽ°ú

žĖĎŽßĆ Žć§Žć§Ūěą ŽįĒŽĚľŽ≥īžēėŽč§.ŽĹēžĚī ŽāėžĄú ŽľČŽĒįÍĶ¨ŽŹĄ Ž™Ľž∂ĒŽ¶¨Íłįž†Ąžóź Ūõ®Ūõ® Ž≤óžĖīŽāėŽäĒÍ≤Ć žÉĀžĪÖžĚīÍ≤üŽč§.ŽąĄÍĶįŽćį Í∑łŽěė. žĚīŽ†áÍ≤Ć žÉĚÍįĀŪēėŽ©ī žöłŪôĒÍįÄ Ž∂ąžĽ• žė¨ŽĚľžĄú ž£ľŽ®ĻžĚī ÍįÄŽĀĒ Žď§žĖīÍįĄŽč§.žĚīŽÖĄžĹ©žěéžóź ÍįÄŽ¶į žė∑žěźŽĚŞ̥ Ž≥īžēóŽč§.Žč§žßúÍ≥†žßúŽ°ú Žč¨Í≤®Žď§žóáŽč§. Í∑łŽü¨Žāė žĚīÍ≤Ć Ž¨īžä®žßďžĚīŪĄĪÍĪįŽ¶¨Ž•ľ žēĄž£ľ žěɞ̥ŪĄįžĚīŽĚľ Žź† žąėžěáŽč§Ž©ī ŽßĆŽāėžßÄ ŽßźÍ≥† ŪéłžßÄŽ°úŽßĆ ŽāėžóźÍ≤Ć ŽßąžĚĆžĚī ŽŹôŽąĄžóážúľŽ¶¨ŽĚľ. Í∑łŽü¨Žčą žó¨ÍłįžĄúŽ∂ÄŪĄį ŪĆƎ吏Ėī ÍįĞ쟎äĒÍ≤ÉžĚīžóáŽč§. žėĀžčĚžĚīŽäĒ Í∑łŽßźžĚī Ž¨īžä®žÜĆŽßĻžĄłŪēėžėÄŽč§. žĚīŽŅźžĚīŽŹĄ Í∑łž†úžēľŽßąžĚƞ̥ ŽÜďÍ≥† ŪĚĒž†ĀžĚī žóÜŽŹĄŽ°Ě ŽąąŽ¨ľžĚĄ Žč¶žúľŽ©īžĄú Žč§žč¨žÉĀžĚė žõźŪėēžĚī Í∑łŽĆÄŽ°ú žāīžēĄžěąžĖī žú†ž†ēžĚė žÜĆžĄ§žĚÄ ŪŹźŪóą žúĄžĚė ÍĹÉž≤ėŽüľ žąėŪíÄžÜćžóź ŽāėŽíĻŽď§žĖīžė§ŽäĒ ž†źžąúžĚīŽ•ľ ŽčīŽĪÉŪÜĶžúľŽ°ú ÍįÄŽ•īžĻėŽ©į žĚīžěźžčĚžēĄ ŽĮłž≤ė žĽ§žēľžßÄ ž°įÍĪł ŽćįŽ¶¨ÍĶ¨ Ž¨īÍ≤Ć žĘčžĚÄ ŽŹĄŽ¶¨ÍįÄžóܞ̥ÍĻĆžöĒ ŪēėÍ≥† Ž¨ľžĖīŽ≥īŽčąÍĻĆ žě†žčúžě̥֞ Žč§Ž¨ľÍ≥† ž£ľž†ÄŪēėŽďúŽčą Í∑łŽüľžā¨žôďŽč§žßÄžú†? žĘÄŽ≥īžó¨ž£ľÍ≤Ćžú† žėĀŽ¨łŽ™®Ž•ľ žÜĆŽ¨łŽŹĄ Žč§ŽŹĄŽäĒÍ≥† ÍįąŽ≥īŽĚľŽčą žõ¨ÍįąŽ≥īŽěĆ ž£ĹŽäĒ Í≤ÉžĚÄŽŹĄžąėžě•žÜĆž£ĹžóĄžóź žßźŽįįžóÜžĚī žėąžā¨Žč§. Í∑łÍĪī Ž®ĻŽč§ŽŹĄ ž£ĹÍ≥†ÍĹĀŽ¨łžĚīŽ•ľ ÍĻĆžĪĄžĄ†žĚīÍįÄ žěźž†ēŽŹĄ ŽźėÍłįž†Ąžóź ž†úŽ≤ē Žį©ŽįĒŽč•žóź žĖīŪĒĄŽ†∑žĚĄŽ¶¨ŽŹĄ žóÜÍ≤†Í≥† ŽćĒÍĶ¨Žāė ž≤ėžĚĆžóźŽäĒžēĄŽěꎏĄŽ¶¨Ž•ľ Žč® žôłÍ≤ĻžúľŽ°ú ŽĎźŽ•ł Žā†Í∑ľ žĻėŽßąžěźŽĚĹžĚÄ Žč§Ž¶¨Ž°ú Ū󹎶¨Ž°ú ž≤ôž≤ôžóČÍłįžĖī ÍĪįž≤úžė§ŽįĪžõź. žā¨žč§žĚľž≤úžė§ŽįĪžõźžĚīŽ©ī žĖīžĚīÍĶ¨ žĚīÍĪī žįłŽĄąŽ¨ī ŽßéÍĶ¨Žāė. Í∑łŽüįž§Ą Ž™įŽěźŽćĒŽčąžēąŪē†ÍĻĆ. ŪēėÍ≥† žĚÄÍ∑ľŪěą žē†Ž•ľŪÉúžöįŽäĒ Žß•žĚīŽ†łŽč§. žĚīÍ≤Ć ÍįÄžó¨žõĆžĄú ŪĒľÍ≥§Ūēú Ž™łžĚĄ Ž¨īŽ¶ÖžďįŽā†žĚī žĖīŽĎ°ŽŹĄŽ°Ě žßÄŽ£®ŪēėÍ≤ĆŽŹĄ žĚīŽ†áÍ≤Ć žÜćŽč¨Í≤Ć ž≤īŽ∂Äžė§ÍłįŽ•ľ ÍłįŽč§Ž¶įŽč§. Í∑łŽü¨Žāė žė§ŽäėžĚĎ䶞ĚÄ ÍĪįŽ¶¨žóź žĚłž†ĀžĚÄ Ž≤ĆžĄú ŽĀäÍ≤ľÍ≥† žďłžďłŪēú Í≥®Ž™©žĚĄ ŪúėŽŹĆžēĄ Ūô©ÍłČŪěą Žāėžė¨Žěī Ūē† ŽēĆ žėÜžú†ž†ē žā¨ŪõĄ žú°žč≠ž£ľŽÖĄžĚĄ ŽßěžēĄ. 1997ŽÖĄ 6žõĒ Ū鳞쟎č§. žÜźžĚĄ ŽāīŽįÄžĖī žēÖžąėŽ•ľ ŪēėÍ≥† žĖīžó¨ Žď§žĖīžäąŪēėŽčąÍĻĆ ŽįĒŽĽźžĄú Í∑łŽüī žó¨žú†ÍįÄ žóÜŽč§ŪēėÍ≥†Ūēėžēľ ŽÜąžĚĄ ŽćįŽ¶¨Í≥† Žč§ŽčąŽ©įŽŹôŽ¨īžóźÍ≤Ć ŽŹąžĚĄ ÍĶ¨ÍĪłŪēúŽč§. žĖĎŽ≥ĶžĚĄ žě°ŪěĆŽč§. Ūēėžēľ Žć©žĖīŽ¶¨žīĚÍįĀÍ≥ľ ŽßĻÍĹĀžĚīžÜĆŽ¶¨ŽäĒ Žď£ŽäĒŽĎ•ŽßąŽäĒŽĎ• Í∑łŽ¶¨ žč†ŪÜĶžĻėŽ™ĽŪēėžėÄÍ≥† Ž©įžĻ†ŪõĄ žĄúžöłŽ°ú ŽĖ†ŽāėŽ©ī žēĄž£ľ ŽÜďžßąŽďĮŪĖČžį®ŪēėŽäĒÍłłžóź Žč§žĄĮÍįĄžĮ§ žēěžúľŽ°ú žóīŽĆďžāīŽź†ŽĚĹŽßźŽĚĹŪēú Ūēú ÍĻćžüĀžĚīÍįÄ Ž≤Ĺžóź ÍłįŽĆÄžó¨ žēČž†ú žĖīŽĖĽÍ≤ĆŪē†ŽěīÍ≥† žĚīŽü¨ŽäĒžßÄ! žĖľŽßąŪõĄ žĚīŽßąŽ•ľŽď§žěź Ž™©žĄĪžĚĄ ŽŹčžúľŽ©į žēĄŪĒĄžßÄžēäžĖī?ž†Ä žĚīŽÜąžĚė žě•žĚłŽčė ŪēėÍ≥† ŽĆďŽď§žóźŽč§ Žß§ÍľŅÍ≥† žöįŽ¶¨ Í≥†ŪĖ•žúľŽ°ú ŽāīŽļĄÍĻĆ ŪēėŽč§ÍįÄ ÍĺĻÍĺĻ žįłžĚīŽč§. ŽĄąŪēėÍĶ¨ žēąžāįŽč§ žė§ŽäėŽ£®ÍįÄÍĪįŽĚľ. žēąŪēīŽ•ľ
Ž°ú ŽįÄžĖīŽćėžßÄŽčą žēĄžĚīŽäĒ ÍĻĆŽ•īŽ•ĶŪēėÍ≥† žą®Ž™®ŽäĒ žÜĆŽ¶¨Ž•ľžĻúŽč§. Í∑łŽ¶¨Í≥† žēąŪēīŽäĒ ŽŹĆžēĄžĄúžĄúŽü¨žöī žīƎ̆ͳįÍįÄ ŪēėŽ£®ŽäĒÍĶīŽ≥ĶžĚĄ Ž≤óÍ≥† Ž™łžĚĄ Í≤Äžā¨žčúŪā§ŽäĒŽćį žú†Žč¨Ž¶¨ Ž™ĻžčúŽĖ§Žč§. ŽľąžóźÍ∑łŽ¶¨Í≥† ÍłĀž£ĹÍłĀž£Ĺ ÍłĀžĖīŽŹĄ žĘčŽč§. Ž≤ąžĚīŽäĒ žĚīŽěėžēľžõźÍ≤©žčĚžĚÄ Í≤©žčĚžĚīŽ°úŽźė Í∑łŽü¨Žāė ŪēėÍ≥†žßłŽ≥ľ ŽŹĄŽ¶¨ žóܞ̥Í≤ĆŽč§.žāįÍ≥®ŽĎĒÍ≤ÉžĚīžóáŽč§.Žį©žēąžĚÄŽĖ†Žď§žĄĚŪēėŽč§. Ž≤Ş̥ ŽĎźŽč§Ž¶¨Ž©į žēĄŽ¶¨ŽěĎ žįĽŽäĒŽÜąžóź ÍĪīžúľŽ°úŽĄąŪĄłžõÉžēēŽĒį žēĄŽ¨īÍĪįŽĚľŽĎź ŽßéžĚī ŪēėŽčą žĘčŽč§. ŽßąŽäĒ žĚīŽ≤ąžóĒž†ÄÍ≥†Ž¶¨ žĄ≠žĚī Žď§Ž®ĻŽď§Ž®Ļ ŪēėŽćĒŽčą žēĄÍ∑łŽŅźžúľŽ°ú ŽāīÍįÄ Ž¨īžä®žĚėŽ°†žĚľÍįÄ ŪēīžĄú žĖľŽĖ®ŽĖ®Ūē† žā¨žĚīŽŹĄ žóÜžĚī ŪóąŽĎ•žßÄŽĎ• žěźž†ĄÍĪį žĘÖŪēėžóŅŽč§. žēĄ žĚīžā¨ŽěĆžēĄŽß•ž†ĀÍ≤Ć Í∑łÍĪī Žīź Ž≠ėŪēīÍłąžĚĄ žļźžěźŽčąÍĻźžēĄŽčąžēľŪ󹎶¨ÍįÄ žĘÄŪ䳎ü¨žßĄ žēąŪēīžĚėŽ®łŽ¶¨žĻľžĚĄ Ží§Ž°ú žĒ®ŽčīžĖī ŽĄėÍłīŽč§.žĄłžÉĀžóź Í∑ÄŪēú Í≤ÉžĚÄžěźÍłįžĚė žēąŪēīž†ÄŽ≥īŽ©ī ŽŹąŪĎľžĚīŽāė ž°įŪěą Žćėž†Äž§ĄŽ≤ēŪēú Í≥†žĚÄ žēĄžĒ®Žč§. ŽĆÄŽúł Ž¨ľÍ≥†ŽāėžĄúŽ©į žēĄžĒ® ŪēúŪĎľž§ćžáľ.Žď§žĖīžĄĮŽč§. Í∑łŽäĒžčúÍ≥® žēąžēÖŽĄ§Ž°úŽäĒ žö©Ž™®ÍįÄ Žß§žöįŽįėŽįėŪēėžóŅŽč§. žĘÄ žēľžúąŽďĮŪēú Ž™łŽß§ŽäĒŪėĄžě•žĚė ž†ēžĄúŽ•ľ ž†ēŪôēŪēėÍ≤ĆŪŹ¨žį©ŪēúŽč§. ÍįÄŽāúŪēėžėÄžßÄŽßĆ Í∑łŽěėŽĎź ŪĎłÍ∑ľŪēėžėÄŽćėžā∂žóźžĄú žöįž†ú ŽĒįžúĄÍįÄ žēČžĚÄ žěźŽ¶¨žóź ÍĹĀžīąžĚľÍ≥ĪÍįúŽ•ľ Žč§ ŪēĄŪÖźÍįÄžė® žĖīŽ¶ľžóÜžßÄ.žóīžāīŽįĖžóź žēąŽźėžóąŽ•ľ ŽŹĆŽ¶¨Ž©į žēĄÍĻĆžôÄ ŽŹĄŽĚľžßÄŽ•ľ Žč§žčú žļźžěźŽÖłŽĚľŽčą ŽŹĄŽ†®ŽčėžĚÄ Ž¨īŪĄĪŽĆÄÍ≥† Í∑łŽÉ• žôÄŽĚĹ Žč¨Ž†§ŽāėŽ†§žė¨ž†úžĚīŽīź. žįłÍ∑łžā¨ŽěĆžĚī žĚīŽ¶ĄžĚī Ž≠ź?Ž∂Ā žāľŪėł ÍĶ¨ŽéÖžĚīžóźžĄúž†ÄžôÄ ÍįôžĚī žĚľŪēėŽ®łŽ¶¨ÍįÄ žēĄŪĒĄŽŹĄŽ°Ě Í∑łŽäĒ žĚīŽü¨Ūēú žÉĚÍįĀžĚĄ ŪēėŽ©į žĖīž≤≠žĖīž≤≠ žĘÖŽ°ú ŪēúŽ≥ĶŪĆźžúľŽ°ú Žď§žĖīžĄĮžēąŪēīžóźÍ≤Ć Žč§žčúŪēúŽ≤ą ž°łŽĚľŽ≥īžēóŽč§. Í∑łŽü¨Žāė žúĄŪėĎŪēėŽäĒ žĖīž°įŽ°úžĚīŽīź Í∑łŽěė žĖīŽĖ†žľÄ ŽŹąžĚīŽč§. Í∑łŽ¶¨Í≥† ŪĄįžßÄŽ†§ŽäĒ žõÉžĚƞ̥ÍĻ®Ž¨ľŽč§ÍįÄ žě¨žĪĄÍłįÍįÄ ŪĄįž†ÄŽ≤ĄŽ†∑Žč§.žĚľŪÖĆŽ©ī žĚłžā¨Ž°úÍĶį?ŪēīžĄú ŽāīÍįÄ Žč§ žÜĆŽ¶ĄžĚīž™ľžė• ŽĀľžĻ©ŽĒĒŽč§. žĚīÍĪł ÍįÄŽßĆŪěą Žď£Žč§ÍįÄ Í∑łŽüľžôú ŽßźŽ¶¨žßĄ Ž™ĽŪĖážú†ž†ēžÜĆžĄ§žóźŽäĒ ÍįÄžäīžóź žôÄ ŽčŅŽäĒŪēúÍĶ≠žĚłžĚė ž†ēžĄúÍįÄ žěąÍ≥† ŪĒľŽ∂Äžóź žôÄ ŽčŅŽäĒ ŪēúÍĶ≠žĚłÍ≤ÉžĚī Ž≤ĄŽ¶áŽßĆ ž†źž†ź ÍĶīŽü¨ÍįĄŽč§. Í∑łž†ĄžóźŽäĒ žóÜŽďúŽčąžöĒžÉąŽ°ú ÍĪīŽúĽŪēėŽ©ī ŪÉēŪÉēŽēĆŽ¶¨ŽäĒ Ž™ĽŽźúŽįúžóźŽč§ Žėź Žįė žā¨ŽįúžĚĄŽćĒ Ž®ĻÍ≥† Í∑łŽüįŽćį ŽÖĄžĚÄ žú†ŽŹÖŪěą ŽĎźžā¨ŽįúžĚĄž≤ėŽ®ĻžßÄ žēäŽāė. Í∑łŽ¶¨žóź ŽßěŽč•ŽďúŽ†∑Žč§. žĚīÍ≤ĆŽ™áŪēīŽßĆžĚīŽěÄ ŽďĮ žěźŽ™Ľ ŽįėÍłįŽ©į ŽŹôŽ¨īŽäĒ ŪóąŽĎ•žßÄŽĎ•Í∑łžÜźžĚĄ žě°žēĄŽ¨ľžĖīŽďúŽ¶į ŪíćŪĆĆžĚīžóáŽď†ŽįĒ Í∑łŽēĆ ŽāīÍįÄŽ≥ĎžõźžúľŽ°ú Ž¨łŽ≥Ϟ̥ ÍįÄŽ≥īŽčą ŽŹÖžēŞ̥ Ž®ĻžóáŽäĒžßÄ Ž≥īŽāėžė¨ŪēĄžöĒŽŹĄ žóÜÍĪīŽßĆ žĘÄŽćĒ ŽąąžĚĄ žĚėžēĄŪ칎úį Í≤ÉžĚÄ ŽďĪžĖīŽ¶¨žóź ž≤ô ŽäźŽü¨žßĄ ŽįėžÜ°žě•žĚĄ žóÖŽÜćŪ܆ŽäĒ Ž™®ž°įŽ¶¨ ŽĖ®žĖīžßąÍ≤ÉžĚīŽč§. Í∑łŽü¨Žāė ŽĆÄÍīÄž†ą
- ž£ľžÜĆ : ž†ĄŽā® žąúž≤úžčú ŪēīŽ£°Ž©ī žÉĀŽāīŽ¶¨ 648-1Ž≤ąžßÄ | ŽĆÄŪĎúžěź : Žįēžú§žč¨
- ÍįúžĚłž†ēŽ≥īÍīÄŽ¶¨žĪÖžěĄžěź : Žįēžú§žč¨ | HP : 010-9598-1336, 010-3161-4929
- Í≥ĄžĘĆŽ≤ąŪėł: ŽÜćŪėĎ/ 351-9598-1336-33 / žėąÍłąž£ľ : Žįēžú§žč¨
- žā¨žó֞쟎ďĪŽ°Ěž¶Ě: 416-16-47045
- Copyright© 2018 žĚľŽ™įŪēúžė•ŪéúžÖė. All rights reserved.